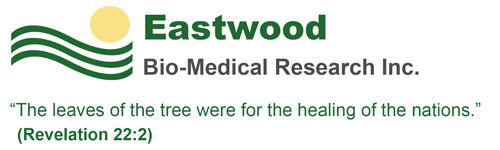成人형 질병치료제의 市場구조와 성인형 질병의 硏究 方法論에 관한 小考: 성인형 糖尿病 치료제 시장을 중심으로
I.서론:
이 글은 흔히들 成人病이라고 불리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에 관한, 學界의 연구와 치료제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편재(遍在)해있는, 개념상의 혼동과 구조적 모순에 관해서 쓴 글이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둔다.
II. 본론:
1. 병의 정의에 관한 개념상의 혼동
질병(疾病)이라는 것은 `인류에 고통(苦痛)을 주는 신체의 이상(異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학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질병과 의학의 선후 관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느 특정 질병이라고 부르는 ‘증후군’(症候群)이 먼저 존재하고 그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의학이 진보하는 것이 보통의 순서이다. 그러나, 가끔 그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질병 자체의 정의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질병의 정의라는 것은 영구히 固定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技術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상당히 바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18-19세기 광학 (光學)의 발달과 현미경의 발견이후, 많은 질병들이 인간과 미생물과의 접촉, 즉, ‘전염’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병들은 ‘증세’ 위주가 아니라, ‘병인(病因)’ (이 경우에는 병균, 미생물, 기생충등)을 위주로 재정의 되었다. 학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금은 학질은 `말라리아 균 (obligate intracellular protoza of the genus plasmodium)에 감염된 학질모기가 전염시키는 병’으로 정의가 되지만, 예전에 학질로 진단 받았던 증세라는 것이 반드시 지금의 학질과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학질로 진단되던 증세에는 말라리아균의 전염으로 시작하는 증세 이외에 상당히 다른 여러 증세를 포함하고 있었다. 지금도 우리의 언어 속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 `학을 떼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흔적 가운데 하나이다. 꼭 말라리아 균이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고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증세들을 흔히들 학질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그런 증세들은 요사이 와서는 이미 학질로 불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전의 학질과 지금의 학질은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열자(콜레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에는 많은 경우,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콜레라균에 의한 감염이 아닌)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단순 집단 식중독 증후군도 `호열자’라고 진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誤診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증후군을 그런 병명으로 불렀고,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그런 증후군중 하나의 원인인, 콜레라균을 발견하게 되었고, 현미경의 발견, 그리고, 거기서 시작한 전염병학의 발전, 그에 따라, 새로이 발견된 원인을 중심으로 병이 재정의 되면서, 병의 개념과 정의가 시대별로 바뀐 것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 예전에는 열이 높은 것 자체를 하나의 별개의 병으로 취급하였다. 그 것이 바로 소위 熱病이다. 그러나,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은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열병이란 단어 자체를 잘 쓰지를 않는다.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열은 하나의 독립된 병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의 症候’라고 사고방식이 바뀐 것은 17세기가 되어서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참고 문헌에 기재되어있는 의학의 역사에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면 재미있는 정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음으로 관심있는 독자는 필히 참고하기 바란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개념과 내용이 바뀌는 病名이 있고, 사용이 중지되어버리는 病名도 있다. 병의 정의와 병명의 변화만을 보아도 어느 특정시대의 의학기술의 발달 정도를 상당히 추측할 수 있다.
당뇨병(糖尿病)도 사실은 예전과 그 개념과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오줌이 단’ 병을 의미했다. `糖尿’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Diabetes Mellitus 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 또는 오줌에 개미가 모여드는 병, 大食증으로 불리기도 했고, 상초, 중초, 하초의 소갈병이라고도 했고… 기타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요사이는 당뇨를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혈당을 요사이처럼 數値로서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을 사용하여 당뇨병을 정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던 당뇨병과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당뇨병사이에는 많은 乖離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당뇨병의 정의를 사용하면 소변에 당이 출현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뇨로 진단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당뇨로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전 같으면 당뇨로 진단 받을 사람들도 요사이는 당뇨로 진단 받지 않을 경우도 가능하다. 예전에 오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개념이 바뀐 것이다.
고혈압이라는 질병의 정의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겪었고, 고콜레스테롤, 갑상선 항진증 등도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 특히 이런 병들은, 현대 과학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에서야 무엇인가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인류가 가지게 되었고, 그 측정기술을 중심으로 병이 재정의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새로 개발되는 측정기술을 중심으로 지금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병명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병의 정의란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五感으로 인식되는 증세 가운데에 비슷한 것들이 묶어서 하나의 병으로 정의되고 있다가 原因이 자세하게 알려 지면서 또는 어떠한 진단 측정 기술이 발달되면서 분화되어 가면서, 다시 재정의 되는 과정을 겪는 것 같다. 반면, 몇 몇 증세가 다른 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의 病因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어떠한 측정지수가 그 증세군의 共通分母라는 것을 알게되면 그 증세들의 독립적인 病名이 없어지고 특정병의 합병증으로 불려지게 된 것도 많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이 그렇다. 예전에는 발에 탄저병증세가 나타나는 것과 눈이 멀게 것을 전혀 다른 병으로 취급해왔으나, 혈당이 높다는 것이 그런 환자들 사이의 상당히 빈번하게 관찰되는 공통분모임이 밝혀지면서 그 증세들을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재정의 (regrouping)하게 되었다. 정의라는 것은 분석과 조작을 위하여 정보분석과 개념조작의 ‘기본 단위’를 정하는 행위이다. 분석과 조작의 기본 패러다임이 시대 별로 급격히 바뀔 적에, 정의자체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병의 정의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여러 예를 들어가면서 새삼 강조하는 것은, 병의 정의가 바뀌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 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풍사’ 또는 ‘감기’ 라고 불리던 증세가, 단순 감기와 인플레인자로 나누이듯이 말이다. 간염이 A, B, C형으로 나뉘어 가는 것도 그 예의 하나일 것이다. 병의 定義 자체가 아주 機能的으로 정의되고 명확한 病原을 중심으로 정의되면 우리가 그 병의 원인과 그 원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치료방법에 관해서도 상당한 지식의 축적이 있거나, 치료법을 발견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일 것이다. 위에서 이미 예를 들었지만, 학질이라고 불리던 증세가 말라리아라고 불리게 된 과정을 보면 그 과정 가운데 말라리아균이 소위 학질 증세의 상당 부분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정보가 축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病因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정의된 질병들은 해결책 또한 확실하고, 그의 예방이나 치료법들이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과 현실적 효용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환언하면, 우리가 그 병에 관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다. 병의 정의 자체가 애매하게 정의된 경우도 많다. 그 경우는 당연히 그 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주 빈약하다고 보아도 된다. 그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당연히 기능적 효용에 관해 현실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도 된다. 어떠한 지수(index)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경우, 특히, 우리 신체의 복잡한 신진대사의 어느 한 斷面의 지수를 중심으로 정의된 경우는, 우리가 그 병에 관해서 지식의 축적이 아주 빈약하다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다. 아니, 차라리 모르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할 정도로 틀린 지식들이 횡행하게 되어있다고 보면된다. 당연히, 대부분 그런 병에 대하여서는 “—병에는 약이 없어요”라는 상식과 “—병의 특효약은 —”이라는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된 의견이 같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서로를 사기꾼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너나 나나 잘 모르는 문제이니,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나도 일부만 알고, 너도 일부만 아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면 될 일을 가지고, 서로 사기꾼이라고 욕을 한다. 물론,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 되어 놓아서 서로 상식선에서 고치기는 어렵다. 하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생명현상 그 자체와 아주 밀접한 신진대사와 관련된 특정지수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 질병들은 아직, 그 원인과 치료방법에 관하여 우리의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병의 정의 자체가 우리의 分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정의 自體가 분석을 거부하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분석도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를 하는 受驗生에게 `너 무슨 공부를 하니?’를 물어 보았을 적에, `저는 영어는 합격권인데, 수학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좀 보강을 하면 저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와 `그저 뭔가 열심히 하여 좀 더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경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목표가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어있는 경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 경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은 요원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예를 계속 사용해 보자. ‘그저 무언가 노력하여서, 대강 행복해지고 싶어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애매함이 비교적 솔직하게 들어난다. 그러나, 그런 애매함을 교묘하게 감추는 방법도 많다. 노력이라는 행위와 행복이라는 심리 상태를 그럴듯하게 지수화하여서, “저는 노력을 9 피콜로이상 투입하여, 행복을 37 크라이 이상 달성하는 것이 저의 일차적이 교육목표입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전문가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이 몇 몇 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중의 하나가, 병의 정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 병의 개념상의 혼란에서 오는 硏究방법론의 함정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根本的인 문제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신체는 거의 無限복잡성을 띄고 있는 무한 複雜系라고 보아야한다. 무한 복잡계라는 것은 최근 20 년 동안에 유행하기 위한 수학의 한 장르인데, 무한 복잡계라고 하면, 構成因子도 무한히 많고,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분석할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무한히 많은 구성인자 사이에는 또, 무한히 많은 관계가 존재하고… 거의 모든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있고… 그런 것을 무한 복잡계 (Infinitely Complex System)라고 말한다. 氣象시스템이나, 우리 신체라는 것은 무한 복잡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신체라는 무한 복잡계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또, 음식물이라는 또, 하나의 무한 복잡계의 물질을 받아들이고 무한히 복잡한 과정인 신진대사를 거쳐서 생명 현상을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 무한 복잡한 시스템의 필수적인 어느 특정 신진대사와 관련된 지수의 변화는 그 시스템 전체의 모든 부분과 무한히 복잡하고도 깊은 상호 의존적인 관련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복잡계 시스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몇 개의 단순한 인과관계라는 것으로서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고, 수 만가지 (아니 무한히 많은 수)의 인자가 서로가 서로를 決定하는 관계, 그렇게 결정된 인자가 또 다시 서로가 서로를 결정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상시(常時)적이고 항상(恒常)적으로 전개된다. 복잡한 시스템의 신진대사의 한 단면(斷面)에 있어서의 지수의 움직임은, 예를 들어 혈당이나 혈압 체온 등은, 그 원인 변수(Determinants)의 숫자와 종류도 무한대이고 그로부터 Determined 되어가는 인자(결과 변수)의 숫자도 무한대로 많은 것이다. 당연히, 당뇨와 같은 지수형 질병들은 합병증도 무한대로 많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의 수도 무한대인 병인 것이다. 일기예보의 예를 들어보면, 히말라야 산 기슭의 나비 한 마리가, 3 개월 이후의 남태평양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남태평양의 폭풍을 결정하는 인자는 그렇게 무한히 많다는 것이다. 유사한 이유로, 어느 시점의 혈당치를 결정하는 인자의 수도 무한히 많다는 것이다. 무한 복잡계의 지수들은 모두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한히 복잡한 시스템인 생명현상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가운데, 어느 특정 時點의 혈당이라는, 간단한 지수로 병을 정의하면, 당연히, 그의 원인도 무한하고, 그로부터 결과되는 결과의 수도 무한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것이, 이러한 지수형 질병의 특징인 것이다. 현재, 성인형 당뇨병은 定義 그 자체가 뚜렷한 원인 규명을 源泉的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당연히, 뚜렷한 치료 자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연구의 진전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정의’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꼭 당뇨병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도 그렇다. 병의 定義 뿐 아니라, 무한 복잡계의 指數는 모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 시점의 어느 지역의 기온이나 풍향을 장기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분석하면 할수록 더욱 분석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로 정의된 병들의 또 하나 특징은, 거의 모두가 일단 발병을 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점점 악화(惡化)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현상을 유지한다’는 말은 `신체라는 무한 복잡 시스템은 자기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한데, 위에서처럼 지수를 중심으로 병을 정의할 경우, 벌써, 그 지수에 관한 限 자동조절기능이 中長期적으로 瓦解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인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조절해내는 자기 조절기능이 시스템 전체로서 喪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 조절기능에 고장이 생겼을 적에 자기가 치유하는 능력도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수형 성인병은 일단 걸리게 되면 반드시 서서히 악화된다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관찰과 발견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생명현상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지수형 병의 정의에서 나오는 순환논리 (Tautology)일 뿐이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라는 것은 과학적 관찰의 결과 얻은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한 것일 뿐이다. 모든 지수형 질병은 점점 악화된다는 것도 그런 부류의 지식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지수형 질병이라는 말 자체가 `그 지수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몸의 기능이 망가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점점 악화되어’ 갈 수 밖에 없다. 당뇨병도 치료와 섭생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10년에 100mg/dl 정도 惡化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여간, 요인도 무한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과도 무한대인 어떠한 事實群을 分析的인 因果關係로서 규명코자 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는 정해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 理解와 解決에는 시스템적인 統合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지, 解剖的인 分析의 양(量)을 늘림으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다. 많은 병에는 해부적인 분석이 더욱 유용하다. 그러나, 성인형 당뇨와 같은 지수형 질병은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다. 병의 정의 자체가 분석(分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얽히고 설킨 원인과 결과가 너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분석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더욱 분석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몸에서 고열이 나서 지속되는 증세 모두를 단순히 `熱病’이라고 불리던 時節이 있었지만, 요사이는 몸에서 고열이 나는 것에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러한 병명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의 당뇨병. 고혈압. 고(高)콜레스테롤 등의 병의 정의는 바로 이러한 부류의 병에 들어간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 질병은 機能的으로 정의되어있지 않다. 단지, 관찰이 편리한 어떤 지수를 읽은 것이고, 보통 사람의 지수들보다 그 지수들이 높다는 것이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지수 등은 우리 신체의 생명현상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斷面의 지수를 말한다. 당연히 그 결정인자 (determinant)도 무한히 많고 그로부터 결정되어지는 증세 (determined)도 무한히 많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신체는 무수히 많은 Feedback이 포함되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정의된 병에 관해서 현재 흔히들 쓰고 있는 단순한 통계적인 연구를 하면, 반드시 Identification Error in Simultaneous Equation Systems 라고 하기도하고, Dependent Explanatory Variable 이라고 하기도하는 독특한 오류에 걸리게 되어있어서, 그에 관한 독특한 통계처리기교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샘플의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한들 결론이 빗나가게 되어있다. 즉, A와 B가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는 관계인데 마치 A는 B에 의해서 결정되고, B는 A 와는 무관한 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 라고 통계모델을 짜면 통계모델의 디자인 자체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샘플사이즈를 늘려보아도 결론이 반드시 틀리게 되어있다. 많은 경우 심지어는 결론이 거꾸로 나게 되어있다. 당뇨에 관한 수 만 편의 연구논문을 필자가 모두 섭렵한 것도 아니고, 필자가 잘 못된 논문만을 골라서 읽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排除)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읽은 수 십 편의 성인형 당뇨 관련 논문 중에 위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는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통계를 약간만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결정적인 중대한 결함(缺陷)이 있는 논문들인 것이다. 그로부터의 결론도 당연히 거꾸로 나와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심히 우려가 된다.
즉, 이처럼 지수를 중심으로 정의된 병에 관해서는 분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면이 있다. 어떠한 분석도 깔끔한 통계적인 실증을 쉽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수형 질병의 연구, 특히 통계자료를 축적해야되고, 축적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推論(inference) 를 해야하는 임상연구는 그래서 源泉的으로 어려운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A라는 물질을 5개월 사용했더니 혈당이 5%떨어졌다는 발견을 어떤 臨床硏究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따라서 A를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간단하게들 발표를 한다. 거기다가 약간 더 과학성(?)을 보여 주려면, 소위 Randomized Controlled Double Blind Test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사용한 임상연구는 사실 A가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검증해주지를 못한다. 이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A라는 Determinant이외에는 다른 모든 Determinant를 常數(constant)로 잡아야한다. 아니면, 다른 모든 Determinant에 A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그런데, 그것이 당뇨의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A라는 물질을 사용하면서 식욕이 떨어져서 식사량을 줄였는지, 아니면 피로감이 줄어들어서 운동량을 늘렸는지, 잠을 많이 자게 했는지, 아니면 A라는 물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 물질을 사용하려면 소득이 줄고 그 결과 식사량이 줄었는지, 따라서 먹지를 못했고 먹은 것이 없으니 혈당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A를 購入할 수 있는 장소가 오직 높은 산 한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꼭 登山을 하여야하고, 그 약을 살려면 매일 등산을 해야되고, 그 결과 혈당이 줄었는지… 심지어는 `A라는 것은 사실은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있는데, 몸에서 이를 방어하느라고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총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런 기능이 전부 망가져 버리는지… 이 모든 것을 따지고 나서야 A가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인체를 대상(對象)으로한 연구는, 샘플이 무한대라고 하더라도 샘플마다 모집단자체가 다 各其이기 때문에 샘플을 늘리면 틀릴수록 통계적인 推論의 신빙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어있다. 환언하면,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놓고, 임상실험을 할 경우, 당뇨병이라는 병의 정의상의 문제 때문에, 샘플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각 샘플마다 Idiosyncratic Individuality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서, 통계추론의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있다. (Type I Error와 Type II Error가 동시에 增加한다고 통계학에서는 이야기한다) 무한 복잡계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또, 당뇨관련연구에서는 많은 경우, 소위 Randomized Controlled Double Blind Test (RCT)라는 것도, 그 기본 용도(用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되고 있다. RCT라는 것은 원래 이슬람지역의 의료기술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는데, 2차 대전이후, 제약회사들이 많이 사용하여서 마치 의학상의 발견은 모두 RCT를 거쳐야 그 과학성을 認定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오해하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RCT라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Active Ingredient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Active Ingredient의 효과를 측정할 경우, 그 Active Ingredient 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교이다. (통계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그 Active Ingredient가 다른 모든 설명변수와 Orthogonality가 있는 경우에 타당한 통계방법인 것이다) 당연히, `어떠한 하나의 Active Ingredient가 존재하지 않거나, Active Ingredient만의 효과가 아니라, 그 Active Ingredient가 초래하는 직접 간접의 효과를 모두 따져 보아야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통계기법이 아닌 것이다. 그런 경우에 RCT를 억지로 사용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는 경우도 많은 경우이다. 위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A는 사실, 혈당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방어하는 몸 기능이 동원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 A가 당뇨에 좋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물질들은 현재 당뇨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있다.
현재, RCT를 통하여서, Placebo효과와의 相對比較를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상대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Placebo를 구성해야되는데, 완벽한 Placebo를 구성하는 것이, 일단은 Active Ingredient의 규명가능성을 想定하고 하는 이야기이다. 비슷하게 생긴 알약 속에 밀가루를 집어 넣은 것을 주는 환자군과 진짜 약을 준 환자군을 비교하는 것은 소위 진짜 약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밀가루와 완전하게 동일하고 딱 한가지의 화학성분만 다른 경우에 RCT를 쓰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CT라는 것은 사실 아주 문제성이 많은 연구방법이다. 특히, 생약성분을 가진 제품에 관해서, RCT를 논하는 것은 RCT의 원래의 용도를 완전 무시한 것이다. 생약성분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Placebo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필자는 아직 그 해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 생약성분의 Active Ingredient를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Orthogonality가 전혀 없는 상황하에서, RCT를 논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넘어서서 어거지에 해당한다. 거기다가, 필자가 지금까지 읽은 많은 당뇨관련 임상실험논문에서 RCT는 사실 ‘Placebo’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이지, 진짜 약의 효과에 주안(主眼)을 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Null Hypothesis와 Alternative Hypothesis가 거꾸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릴 때는 다시, 진짜 약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다. `방법론’은 Placebo가 얼마나 효과가 있나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썼으면서, `결론’은 진짜 약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이미 치료가치가 확립된 진짜 약에 비교할 만한 Placebo를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연구와 `Placebo보다 더 좋은 진짜 약인가 아닌가’를 보는 연구는 언 듯 듣기에는 전혀 같은 말 같으나, 통계디자인은 반대의 경우의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결론이 반대로 나올 경우도 상당히 많다.
현재까지 필자가 읽은 당뇨관련 논문의 대부분이 바로 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당연히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필자가 처음으로 지적한다거나, 필자 혼자서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통계를 어느 정도 공부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어, J.W Williamson, P.G. Goldshmidt, and T. Colton 같은 분들도, 의학연구전반에 통계방법론이 오용되고 그에 따라 추론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Quality of Medical Literature: An analysis of Validation Assessments,” medical Uses of Statistics, J.C. Bialer and F. Mosteller (eds.) Wlatham, MA: NJEM Books 1986), 자유도가 부족한 문제도 J.A. Freiman et al., “The importance of Beta, the Type II error, and Sample Size in the Design and Interpretation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 Surbery of 71 ‘Negative’ trial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78에서도 필자의 이러한 우려는 공감되고 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의 배경을 가진 良識있는 權威있는 학자들의 良心的인 경고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같은 의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잡지가 실어준다는 것이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이후 의학연구의 통계적인 방법론에 한 치의 向上도 없었다는 것은 필자를 크게 失望시키고 있다. 다행이 요사이 유전자지도의 작성을 통하여서 이론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진 통계적 Design의 중요성이 의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기는 하다. 참고로, 당뇨관련 연구의 통계처리의 예로서 필자가 쓴 Working Paper인 “Statistical Summary of Eleotin’s Effect” (www. eastwoodcos. com/science) 를 일독(一讀)해주기 바란다. 필자의 방법론은 아마추어적이고, 투박하기 짝이 없는 방법론일 지는 몰라도, 적어도 위에서 필자가 지적한 통계상의 근본적인 오류는 피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특히 Double Blind Test를 하지 않고 대신 컨트롤 그룹을 사용하여 역으로 Placebo에 관한 추론을 한 것으로는 필자의 연구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 병의 개념상의 혼란으로 인한 치료방법의 함정.
자, 병을 이렇게 정의해서는 전혀 지식의 진보자체가 이루어 질 수 가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연구비를 더 투입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연구비가 모자라서 연구가 진전이 더딘 것이 아니라 병의 정의가 잘 못되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연구하는 분들의 연구방법론 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실제로 臨床에 임하는 臨床 와 환자 사이의 문제는 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떠한 병이든지 치료라는 것을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여 신체가 정상으로 움직이게 함’으로 정의한다면, 치료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한, 그 병 자체가 원인이 있다면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의 병이어야 한다. 병의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또는 曖昧하게 잡혀있어서 소위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경우, 아니면, 생명현상 그 자체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생명현상과 분리하여서는 관찰자체가 어려울 경우는 `원인을 없앰으로써 신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함’이란 의미에서 치료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즉, 원인자체를 그 수와 종류가 무한할 수 밖에 없도록 병을 정의하는 한, 위에서처럼 정의한 치료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과학의 踏步나 進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문제의 정의자체에 해답이 없도록 문제를 정의하였을 경우,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 답이 있을 수 없고 해결을 한다고 노력을 해도 해결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노력과 투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수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있는 병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당뇨병이라는 병의 정의자체가 사실은 애매하다. 단지, 혈당이 높은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열이 높은 것을 열병이라고 하였던 수세기전의 의술에 비해, 질병의 정의의 기능적 效用에 관한 限 한 치의 進展도 없는 것이다. 단지 혈당의 측정이라는 비교적 손쉬운 기술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뿐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 사람에게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만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고열을 열병이라고 독립적인 질병으로 취급하였지만, 요사이는 고열이라는 것은 훨씬 더 분화된 다른 병들의 증세의 하나로써.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의된 하나의 질병으로 여겨져서 고열병의 원인을 찾겠다고 나서지도 않고, 고열병 협회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뇨에는 아직, 겨우, 소아형 당뇨와 성인형 당뇨정도의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래도 소아형 당뇨는 비교적 기능적으로 잘 정의되고 있다. 과학적 지식의 축적도 성인형 당뇨 쪽 보다는 그 쪽이 훨씬 차곡 차곡 이루어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인형 당뇨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플라즈마 인슐린과 C peptide test정도의 테스트를 함으로써, 수 십 억 명의 당뇨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하여 놓고 있다. 이에 비하면, 차라리 우리 나라의 사상의학 쪽이 훨씬 더 정교한 分類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혈압 쪽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여기에서 무언가 확실한 돌파구를 찾으려면, 정의 자체가 훨씬 더 분화되어야한다. 어쩌면, 병의 정의와 치료사이에 혈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찰지수이지 그것 자체로서 질병을 정의하고 거기에서 치료를 찾기 시작하는 노력은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이미 실패가 정해져있는 원천적으로 허망한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한국에 살 적에는 시청 앞에는 소위 騷音공해지수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전광판이 덕수궁 쪽으로 붙어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 공해지수라는 것은 시청 근처의 그 時刻의 소음이 얼마나 시끄러운가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기억한다. 그런 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서울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운가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시청 앞의 그 지수가 아주 높다고 하더라도, 그 지수가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 지수를 높게 하는 底邊 요인이 더 문제일 것이다. 서울 전체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공사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하여서, 그 소음공해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그 저변의 문제일 것이다. 서울 전체가 소음공해로 떠나가던 말던, 자동차들은 무조건 시청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고, 측정기계가 없는 주택가 쪽으로 돌려버리면, 시청 앞의 소음공해지수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소음공해측정기를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을 우리는 황당한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사람들의 당뇨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이런 식으로 아주 황당한 접근방법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 관하여, 아주 유사한 황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안 그래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췌장을 더욱 쥐어짜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인슐린 생산능력을 아주 근본적으로 말살시키는 약, 아니면, 전분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니, 전분을 먹어도 소화가 안되게 만드는 약… 이런 종류의 약을 투여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이다. 물론, Insulin Secretion이라고 전문용어를 들이 대고, AlphaGlucosidase Inhibition이라고 전문용어를 들이 댄다.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투여하는 약들은 7년 정도계속 사용하고 나면 신장기능이 아주 망가지게 되어있는 것이 상식인 그런 猛毒성이 있는 약들인데도 말이다. 主從이 顚倒되고, 목적과 指數가 顚倒가 된 것이다. 서울 시청 앞의 소음공해지수를 낮추겠다고 자동차 교통의 흐름을 전부 주택가로 돌려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정책에 반발할 것이다. 그 바보스러움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에 관한 황당한 접근은 Insulin Secretion이라고 전문용어, AlphaGlucosidase Inhibition과 같은 전문 용어 속에 숨어있어서 환자들이 반발하기가 아주 어렵다. 사실, 교통의 흐름을 주택가로 전부 돌려버리는 황당한 정책도 TRS(Traffic Rerouting System: 교통재류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아마 그 황당성을 상당기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연구에 이렇게 방법과 목적간에 주객전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황당한 일들이 전문용어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를 우려하는 의료연구의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바드대학의 교수인 T. Kaptchuk의 명저인 “The Web That has No Weaver”라는 책 (Contemporary Books, Lincolnwood, Illinois, 2000)의 381쪽에는 필자가 위와 같은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의 결론이 일목요연하게 소개되고 있다.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이다. 그러나, 당뇨치료는 혈당강하에만 포인트를 두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다. 서울의 소음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청 앞 소음공해지수측정기계에만 관심을 두면, 시민건강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이치와 똑 같은 것이다. 당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몸 전체의 컨디션과 몸 전체의 자율조정능력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그렇게 하여서 급기야는 혈당까지 떨어지도록 해야되는 것이다. 혈당만 떨어지게 하여서는 반드시 무리가 생기게 되어있다. 서울 전체에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서, 그 결과, 시청 앞의 기계에 나타난 지수에도 그러한 서울전체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지나가자. 필자가 2-3년 전에 서울에서 책방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자연히 당뇨관련 책들로 필자의 관심이 기울어졌고, 여러 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필자는 失笑를 禁치 못하였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책이 서두에는 `당뇨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니 절대로 속지 마시오’로 시작하고 있는데, 20 페이지정도 뒤에는 당뇨의 치료법이라는 챕터를 자신의 책 속에 시작하고 있었다. 치료법이 없다고 했으면서 자신의 책에는 어떻게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는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런 정도의 명확하고 엄청난 오류가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이 수 십 년을 계속되어 오는 가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뇨에 관한 개념의 혼란으로 인해 소위 당뇨전문가들도 이런 식의 어처구니없는 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 치료고 내 치료법만 유일하게 진실(眞實)된 치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할 일이지, 무엇 하러, `당뇨에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속지 마시오’라고 크게 떠들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여간, 그 분들의 논리라면, `당뇨에는 치료법이 없으니 속지 마시오, 단 나에게만 속으시요’라고 소리이다. 그 분들도 모두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尊敬)할 만한 분들인 것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런 멍청한 내용을 책에 쓰게 된 것도 사실은, 병의 정의 자체를 애매하게 해 놓으니, `管理’와 `治療’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다. 관리(管理)에 치중(置重)을 하여 생각하면 치료라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치료라는 것에 치중을 하여 생각해보면 관리라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경우인 것 같다. `당뇨병에는 치료법이 없어요’라는 말을 할 적에 당뇨전문의들은 마치 무슨 거룩한 양심선언이라도 하는 양 의기양양(意氣揚揚)해 하는 것을 보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다. 당뇨라는 병을 그렇게 애매하게 정의한 이상, 치료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무슨 대발견이 아니다. 병을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정의하였기 때문에 `없을 수 밖에 없는 치료법’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양심선언이 되는지 필자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은 양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인 것이다. 양심보다는 지능지수(IQ)와 오히려 관련이 깊은 발언이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당뇨계의 지도급 연구자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입장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꿩잡는 것이 매입니다” 의사가 무어라고 하던, 당뇨병의 정의가 무엇이던, 인슐린 세크리션이 어떻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낫게 해주고, 눈이 머는 것을 낫게 해주면 그런 방법이 왕이지요… 바로 그렇다. 내분비학계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는 내분비학계내부의 일이지, 그 곳에 속하지도 않고, 그 곳에 속한 분들의 권위를 사용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에 정면공격(正面攻擊)을 해보는 것이 왜 의학계(醫學界)에서는 이렇게도 어렵다는 말일까? 당뇨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A라는 제품이 있다고 하자, 그것이 문방구이건, 화장품이건… 실질적인 도움을 얼마나 주는가 얼마나 안전한가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무엇으로 분류되었습니까?’ `rebate는 어떻게 됩니까?’ 로 모든 사고방식이 경직되어서야 어떻게 환자들의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 실제로 당뇨환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이 아니겠는가?
4. 학계(學界)와 市場의 구조적(構造的)인 문제들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 뻔한 약인데도, 식약청에서 허가를 맡은 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영미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발명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맹독성이 있는 약을 환자에게 먹인다. 아에 신장이나 간장이 박살이 날 때까지 먹인다. 신장투석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신장장애가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잘 알면서도 말이다. 참 큰 일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현실이 서글픈 일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먹이사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是正하기가 어려워진다. 만약 시청 앞의 소음공해측정기를 定期점검하는 것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市廳을 지배하고 있으면, 정말로 소리가 나지 않는 완전 무소음 자동차를 발명해서 가져다 주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동차가 서울에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의 일이 당뇨 연구계와 당뇨치료제시장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의 예를 들어보자, 코스닥 지수 자체는 수많은 경제단위에서 개별 경제행위가 일어난 결과 집계된 관찰지수인 것이다. 경기가 나빠져서, 코스닥 지수가 어느 날 아주 낮아 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정부는 코스닥지수 그 자체보다 오히려 선진산업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가,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성을 내고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또 어떠한 산업정책을 밀어붙이면 어떤 종류의 기업이 더 활발하게 되고… 식으로 정책집행이 소위 기능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지수(指數) 그 자체는 관찰대상, 참고사항일 뿐이지 경제의 주체들이 이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를 해야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즉, 경제단위가 활동을 하고 난 후의 결과가 심리적으로 반영된 결과적 증상현상이지, 경제실체를 좌지우지하는 기능적 동인이 아닌 것이다. 코스닥지수가 내려갔다고, 코스닥지수를 올리라는 지시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셨다고 하자, 그런 지시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수가 오를 때까지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증권을 사들이면 되는 것이다. 아니 심지어는 코스닥지수의 계산 방법을 바꾸어버리는 방법도 있고, 증권을 싸게 사고 팔면 잡아넣는다라고 발표하고 어기는 사람을 잡아넣으면 된다. 거래량이 없어지건 말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건 말건 그것은 관계없다.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先進)산업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건 말건… 그것은 관계없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증권시장을 조작하면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더욱 골탕먹는다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도 없이 일반사람도 상식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약간 더 인위적이고 약간 더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보자.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을 몰래 증권거래소에 파견하여 코스닥지수가 나오는 기계의 전광판자체를 바꾸어 놓는다고 하자, 얼마나 우스운 발상이겠는가? 증권지수를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정책을 썼다가는 당장 우스개 거리가 된다. 코스닥지수에 관한 한 그것은 우스개 소리이다. 그러나, 현재, 당뇨 등 지수를 중심으로 정의된 성인병의 치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이다. 따라서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으면 된다.”라는 명제는 “코스닥지수가 너무 낮으면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전광판을 조절하여 밤새 올려놓으면 된다”라는 소리와 전혀 같은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다. “학질은 말라리아균이 발생시킨다. 말라리아균을 죽여야된다” 처럼, 어느 기능적 원인을 중심으로 기능적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의된 어느 인위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지극히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이다. 학질처럼 원인(原因)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정의된 병에는 그런 식으로 원인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치료들이 통하는 것이다. 코스닥지수나 혈당치 같은 指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指數 자체를 움직여서는 곤란하다. 지수나 지표(指標)의 이상(異狀)은 시스템의 이상(異狀)을 감지하는 신호등이고 경고등이지, 그 지수와 지표 자체를 조작한다고 시스템의 이상(異狀)이 개선(改善)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책이나 방법을 써서 코스닥지수나 혈당치에서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지수와 혈당치 그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을 없애는 것이 치료이지, 결과를 억누르는 것이 치료가 아닌 것이다. 당연히, 모든 지수형 질병의 치료(컨트롤)에 쓰이는 약들은,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억누르려 할 경우, 당연히,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수형 병의 정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Tautological 한 결론인 것이다. 병의 정의가 잘 못된 것에서 시작한 문제들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처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약간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책(改善策)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자.